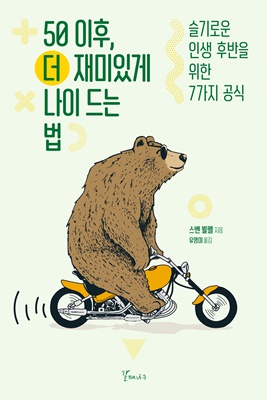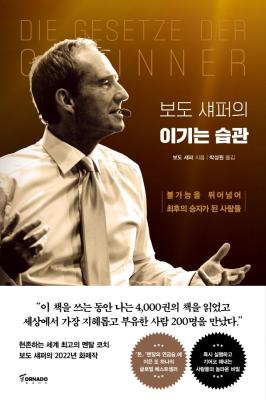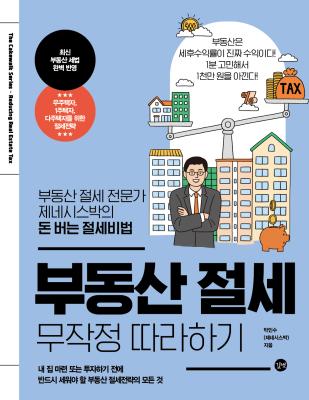2023-07-12
정성득
물고기는존재하지않는다
0
0
보편적인 기준에서, 아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인위적인 것이며 그 기준을 넘어서, 장벽을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를 직면할 것이다. 작가는 현재의 질서가 소수의 Ruler에서 만들어 놓은 계층적 질서를,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의 질서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통제하고 싶은 세상을 벗어나고자 한다. 순수하게 시작된 과학의 세계에서 막상 그 세계를 공부하고 연구할 수 록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실제를 보다 더 직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긍적적 환상을 갖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서서히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터널 시야 바깥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물고리를 포기했을때 해골 열쇠를 하나 얻는다. 이 세계의 규칙들이라는 격자를 부수고 더 거침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물고기 모양의 해골 열쇠, 이 세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며 모든 민들레가 가능성으로 진동하고 있는, 저 창 밖, 격자가 없는 곳.
그 열쇠를 돌리기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단어들을 늘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잘 못 알고 있을까? 과학자의 딸인 나로서는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내가 물고기를 포기할때 나는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다. 과학은 늘 내가 생가해왔던 것 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횃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노자의 철학과 일치한다. 또한 후안엔리 케스의 무엇이 옳은가? 책을 추천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시간에 따라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기준이 바뀐다. 하물며 인간의 도적적 판단기준, 보편적 가치도 변덕거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겸손한 자세를 비추어야 하거늘, 과학이야 말로 새로운 발견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질서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 석은 일인가?
그 질서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자, 그것은 오르디넴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베틀에 단정하게 줄지어 선 실의 가닥들을 묘사하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는 사람들이 왕이나 장군 혹은 대통령의 지배 아래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은유로 확장되었다. 1700년대에 와서야 이 단어가 자연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자연에 질서정연한 계급구조가 존재한다는 추정, 인간이 지어낸 것, 겹쳐놓기, 추측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계속 그것을 잡아당겨 그 질서의 짜임을 풀어내고, 그 밑에 갇혀 있는 생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쓰는 척도들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특히, 도덕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척도들을 의심해봐야 한다.
인체에서 사이질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읽는다. 늘 거기에 있었지만 어째선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그러면 세계는 조금 더 벌어지며 열린다. 그린고 다윈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긴다. 우리의 가정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관해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 볼품없는 박테리아는 어쩌면 당신이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을 그 단단한 가장자리에서 마지못해 뛰어내리게 했던 실연은 결국 더 좋은 짝을 찾게 해 준 선물로 밝혀지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꿈들까지도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희망까지도 어느 정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마직막으로 이 책의 후기를 작가와 아버지의 대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부녀의 대화가 이책의 요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어류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건 이해하지만 유용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세계를 경험한느 제한된 방식에 자신을 가두게 되는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내가 묻자, 아버지는 불만스럽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아고, 나는 그게 뭐든, 아직 내가 해방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해방되기에는 너무 늙었어...
사람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를 것이다.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강요가 필요없는 것이다. 그 질서 또한 바뀌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세로 보편적인 기준, 질서가 변화하는 것을 수용하며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과학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